코스피가 3,000 고지를 뚫고 끝없이 올라갈 것 처럼하다가 다시 3,000 아래로 떨어지면서 주가가 조정 장세에 들어가는가 싶더니 며칠 후 다시 3,000을 돌파하였습니다. 이처럼 지금 주가가 싼지, 비싼지 아니면 적정한지 알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핏지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핏은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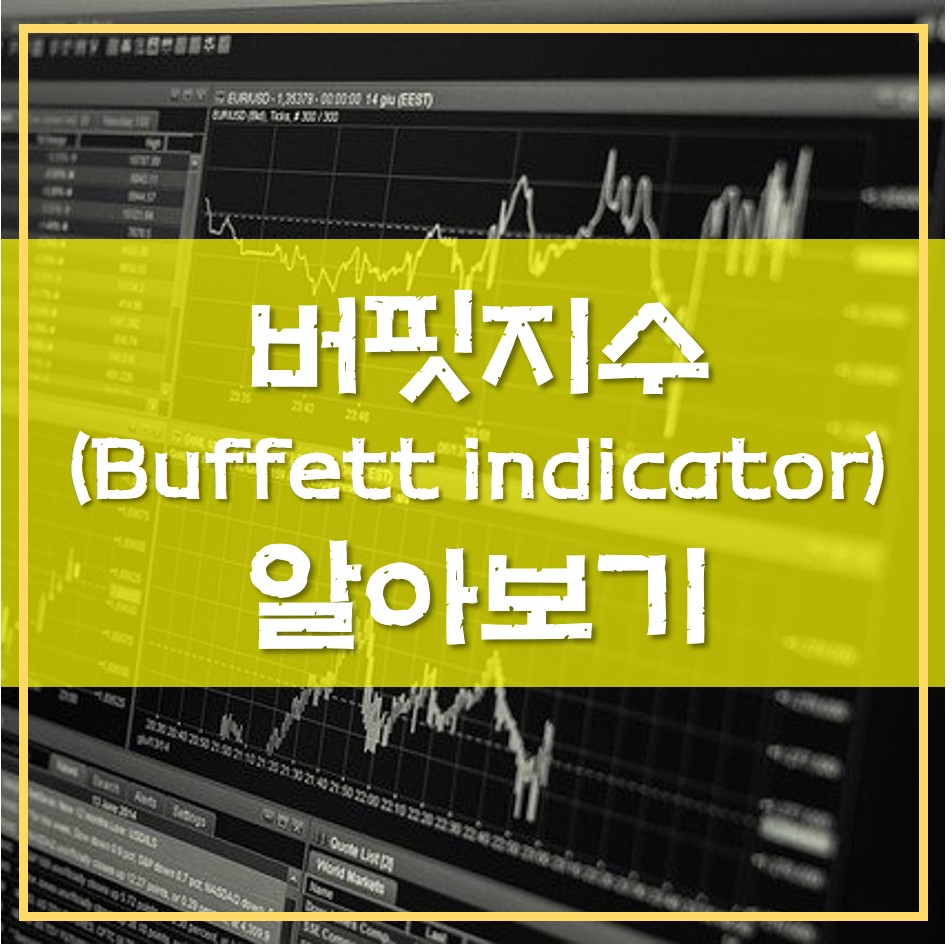
버핏지수란?
버핏지수(Buffett indicator)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을 얘기합니다. 워런 버핏이 2001년 미국의 '포춘'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지수가 적정한 주가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최고의 단일 척도고,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버핏지수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 외국인, 내국인 관계없이 자국 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생산활동을 수치화한 것
GDP와 시가총액이 같으면 버핏지수가 100%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한 국가의 경제와 주식시장의 크기가 같다는 의미로 버핏지수가 80%라면 GDP 대비 시가총액이 80% 수준이라는 것으로 주식시장이 그 국가의 경제에 비해 20% 저평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버핏지수가 130%라면 GDP 대비 시가총액이 130% 수준이라는 것으로, 그 국가의 경제에 비해 30% 이상 고평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니 주가도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주가는 그 나라의 경제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로 인하여 주가만 많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기도 합니다. 주가와 경제와 동행한다는 방향성은 대부분 일치하지만 속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버핏지수가 93~114% 정도면 시장은 적정한 수준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73~93%이면 저평 가고, 73% 이하면 완전한 저평가라고 봅니다. 반면 114~135%면 고평가이고, 135% 이상이면 광장한 고평가라고 봅니다.
작년 말 기준 미국 증시의 경우 버핏지수가 181%로 상당한 고평가인 상태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고평가 받은 이유로는 코로나 19로 인한 셧다운의 영향으로 미국의 GDP는 감소하였지만 미국 연준이 돈을 풀어 경기부양책을 펴면서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주가가 상승했고, GDP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보다 영향을 덜 미치는 서비스업 기반의 플랫폼 기업들의 시가 총액이 커진 것도 한몫을 합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버핏지수로 보면 주가가 비싸다고 생갈할 수 있지만 비싸진 이유를 분석하여 대응 여야 합니다.
현재 한국 증시의 경우 버핏지수가 135% 정도입니다. GDP가 1,919조 원이었고, 코스피가 2,200조 원, 코스닥이 400조 원으로 총 시가총액이 2,600조 원 정도입니다. 버핏지수로 보면 한국 역시 상당히 고평가 상태입니다. 작년 3월 19일 한국 증시가 최저점이었을 때는 버핏지수가 60%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현재 버핏지수는 역대 최고점을 기록 중으로 주가가 언제 급락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분석도 나오는데요. 한국의 경우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동성 장세에 힘입어 호실적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2007년, 2010년, 2017년 버핏지수가 100%에 근접한 다음해 주가지수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는 실물경제보다 일시과열된 증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합니다.
미국은 제조 기업보다는 플랫폼 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GDP와의 연관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제조업 기반의 국가이기 때문에 GDP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에서 버핏지수가 더 잘 맞습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버핏지수를 잘 추적하셔서 성투 바라겠습니다.
이상 버핏지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식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유상증자란? 목적은? (0) | 2021.02.08 |
|---|---|
| 스팩주란? 투자해도 되나? (0) | 2021.02.08 |
| 파킹통장의 모든것 (0) | 2021.02.05 |
| OEM, ODM, CMO 차이 (0) | 2021.02.04 |
| ETF의 모든것 (0) | 2021.02.04 |




댓글